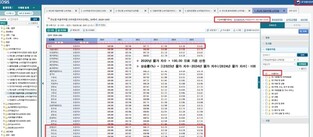수필가 민순혜
 |
| ▲사진=수요음악회 |
목련꽃 그늘 아래
수필가 민순혜
박목월 시인의 시를 가곡화한 ‘4월의 노래’를 즐겨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 가사처럼 목련꽃 그늘아래를 거닐면서 목청을 돋우며 줄곧 노래를 불렀던 것 같다. 그 길은 오래전에 자주 갔던 충남 태안군 천리포수목원(千里浦樹木園, Chollipo Arboretum)에 있는 ‘목련 꽃길’이었다.
그곳에 간 지 벌써 20여년이 지났건만 해마다 봄내음이 느껴질 즈음이면 변함없이 가슴이 시린 것은 목련꽃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천리포 수목원을 바로 지척에 두고도 다시는 갈 수 없는 동토의 땅처럼 차마 가지 못한 채 연민의 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은 설립자 밀러(Miller) 씨와의 각별한 인연 때문이 아닐까. 밀러 씨는 2002년 4월 대장암이 전이되어 폐암으로 작고하셨다.
 |
| ▲사진=수요음악회 |
사실 그분을 알게 된 것은 그다지 특별한 인연은 아니었다. 1993년 여름, 클래식 음악감상 동호회 ‘수요음악회’에서 회원 50명 정도가 숙박이 가능한 하계 수련 장소를 찾던 중 그분이 고문으로 재직하던 회사 직원인 회원의 소개로 처음 천리포수목원을 찾았을 때이다. 당시 천리포수목원은 식물 보호를 위해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하지 않았고 더구나 수목원 내 숙박은 외국인에 한해서만 허용할 때였다. 그러나 밀러 씨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셔서인지 우리들의 숙박을 쾌히 승낙해주셨다.
그때는 대전에서 천리포로 가는 길이 국도라고 하기에는 거칠기 그지없는 구불구불한 산길이어서 승용차로도 네다섯 시간은 족히 걸렸다. 그러나 천리포수목원에서 3박 4일간의 하계수련회는 애초에 목적한 회원 간의 친목 외에도 자연을 접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수목원이 해변에 접해있어서 파도 소리가 들리고 해풍이 불어오는 숲속 오솔길을 걷노라면 모든 시름이 씻어져 가는 듯해서였다.
 |
| ▲감탕나무집((현)배롱나무집) |
우리 숙소는 천리포수목원 후문 쪽에 자리한, 마당이 있는 한옥 ‘감탕나무 집’이었다. 외형은 기와지붕에 기역자로 된 전형적인 한옥이지만 내부는 서양식으로 되어있어서 숙식하기에는 아주 편리했다. 수목원 내 숙소는 모두 그런 형태였던 것 같다. 거실 벽에는 이응로 화백의 그림이 걸려있었다. 감탕나무 집은 마루에 걸터앉으면 숲이 보이고 모퉁이를 돌아 나오면 해변이 시야 가득히 펼쳐지는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였다. 바로 맞은편에 낭새섬이 있어서 썰물 때는 걸어서 섬에 가기도 했다. 밤에는 플래시를 켜고 고기를 잡아서 매운탕을 끓여 먹던, 도시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그런 낭만이 그곳에 있었다.
천리포수목원에서 3박 4일간의 하계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 밀러 씨도 매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음악 감상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회원들과 격의 없이 지내셨다. 그런 인연으로 수련회를 마친 후에도 우리 회원들은 자주 수목원에 갔음은 두말할 나위 없었다. 계절 마다 단체로 가기도 했지만, 그 당시 회원 대부분이 30~40대의 미혼 남녀로 휴일을 이용해서 삼삼오오 팀을 구성해서 가기도 했다. 퇴근 후에 집결해서 출발하면 천리포수목원에는 밤 12시 경에 도착을 했어도 밀러 씨는 귀찮은 내색 없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곤 했다.
그런데 밀러 씨는 한밤중에 뵈어도 늘 정장 차림이었다. 그런데 한복이든 양복이든 자세히 보면 바지 끝이나 소매 끝이 다 닳아서 헤진 것이 무척 검소하게 생활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은 그 때문에 더욱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분은 사람을 대하는데도 평등했다. 밀러 씨 책상 위에는 그곳을 방문했던 각국의 대사는 물론이고 지위가 높으신 분들의 값진 선물이 나란히 진열되어있었다. 그 외에도 동네 이웃분들의 선물도 나란히 놓여있었다. 평평한 판자 위에 직위의 높고 낮음이 없이 선물한 분들의 이름이 일률적으로 놓여있는 것을 볼 때 뭔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곤 했었다.
어디 그뿐이랴. 그분은 모기 한 마리조차도 죽이지를 않으셨다. 천리포수목원은 야산으로 숲길을 걷다 보면 자주 뱀도 보게 되는데 독사도 많다고 했다. 어느 날은 원장실 책상 아래 독사가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집게로 집어서 숲에 놓아줬다고도 한다. 그래서인지 그분은 자주 숲길을 걷는데도 뱀한테 물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
 |
| ▲사진=수요음악회 |
우리는 그곳에 갈 때마다 수목원을 한 바퀴 돌아왔다. 대개 주말에 가니까 밀러 씨와 직원인 이규현 부장이 동행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야산을 지나서 솔밭길, 꽃밭길,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가 등… 마치 그분의 텃밭을 돌아보듯이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숲속 오솔길을 걸었다. 실제 초기에는 밀러 씨와 이 부장이 주말마다 서울에서 내려와 태안에 차를 주차해놓고 천리포까지 바짓가랑이를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십리 길을 걸어 들어와 나무를 심곤 했다고 한다. 그때부터 천리포수목원은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매년 4월 세계 목련꽃 축제가 개최될 때면 내외국인들이 모여 함께 목련꽃 길을 걷곤 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목련 꽃길을 걸으면서 ‘4월의 노래’를 합창하기도 한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질 읽노라
구름 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멀리 떠나와 이름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밀러 씨가 작고한 2002년 4월은 어느 해 보다도 황사가 심했다. 그해는 천리포수목원에 가지 않았다. 4월 1일 천리포 인근 병원에 입원해 계신 밀러 씨를 방문한 것이 그분과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밀러 씨는 산소 호흡기를 댄 채 문병하러 온 산림청 직원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천리포수목원의 나무들을 잘 부탁 한다”고. 밀러 씨가 작고한 후 2005년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숲의 명예전당‘에 초상이 헌정되어 기록되어졌다. 암 투병 중이시던 2002년 2월에는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셨다.
나에게 봄은 천리포 수목원에서 밀러 씨와 ‘목련꽃 길’을 걸으면서 여럿이 목련꽃 노래를 합창하던 때의 그리움으로 가슴을 시리게 한다.
*‘감탕나무집’은 최근에 ‘배롱나무집’으로 바뀌었다. 전에는 집 앞에 감탕나무가 몇 구루 있어서 ‘감탕나무집’으로 불리었으나 감탕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서 ‘배롱나무집’ 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다.
-------------------------------------------------------------------------------
작가 약력
대전 출생. 2010년 '시에'로 등단. 수필집 '내 마음의 첼로'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