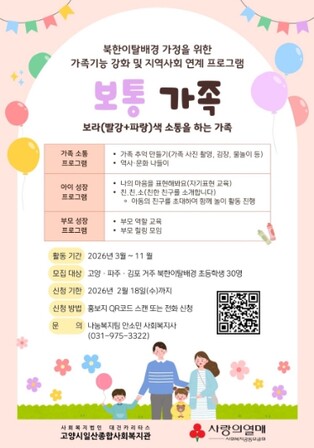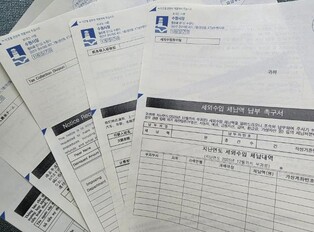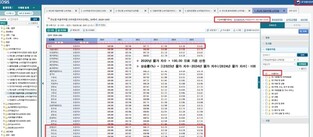|
| ▲ 최문형 성균관대 유학대학 겸임교수 |
조나단 스위프트(Jonathan Swift)의 소설 <걸리버 여행기(1726)> 제3부 ‘하늘을 나는 섬나라 라퓨타’ 에 나오는 이야기다. 제3부는 소인국과 거인국 이야기인 1,2부의 뒤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섬에 사는 상류층 사람들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대목인데, 살펴보면 이들이 편견과 근시안을 가졌을 거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섬은 천연자석의 힘으로 공중에 떠다니는 섬이니 과학기술의 결정체라고 할만 했다. 하지만 해괴한 몰골처럼 이 섬 지도층의 생각은 하나도 실용적이고 쓸 만한 게 없었다.
이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말을 할 사람의 입과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의 귀를 바람 주머니로 살짝 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주인들이 소통 능력이 없으므로 그들이 이 일을 해주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하다.
들어야 하는 사람이 여럿이면 바쁘게 다니며 그 사람들의 귀를 다 때려주어야 한다. 눈과 귀만 때려 주는 것이 아니다. 주인이 길을 걸을 때는 두 눈도 때려서 꼭 경고해야 한다.
“장황하게 떠들어대고 광적으로 흥분하고 사악한 짓을 일삼는 기질 때문에” 정치에 속한 사람들, 상원과 하원과 대도시 의회원들은 질병을 달고 산다.
주인공은 처음에는 이 섬나라 라퓨타의 발달한 과학지식과 우아한 예술세계, 고상하고 품위 있는 상류층을 좋아했으나 그들의 어이없는 실체를 알아채고는 곧 싫증을 느끼고 섬을 떠나기로 마음먹는다. 과학과 예술이 고도로 발달한 이 나라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런데 이러한 행태들이 어쩐지 낯익다. 바로 삐딱한 머리와 초점 안 맞는 눈으로 사색에 푹 빠져 지낸 조선 지식인의 모습이다. 그들이 뽐냈던 ‘과학’은 주자의 학문이었다.
일찍이 한반도에 살았던 조상들은 사람을 살리고 위하는[홍익인간] 진리이면 어떤 것도 받아들여 발전시킬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정치와 종교와 마음수양에 따로 또는 같이 작용했던 이 세 가지 학문이자 이념은 한국인의 균형감 있는 발전과 함께 해왔다.
그러다가 조선에 접어들면서 주자의 학문으로 기반을 잡는다. 주자의 학문은 신유학이라고도 불리는데 근본유학인 공자의 학문과는 사뭇 다르다. 이 주자학이 조선에 장착되면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머리가 삐딱해지고 두 눈의 초점이 안맞게 되었다.
그들의 귀와 눈은 열려있는가? 그들의 입은 해야 할 때 할 말을 하는가?
그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클리메놀’이 꼭 필요하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