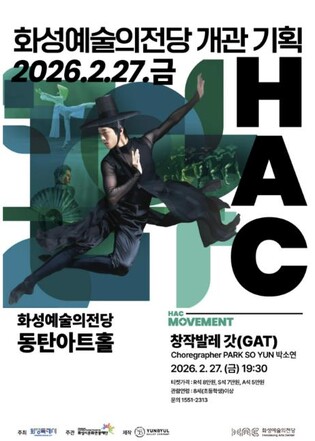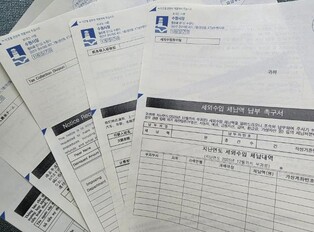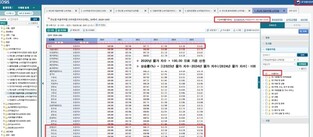이동환 풍수원전연구가
 |
| ▲경기도 포천의 반월성 (사진=문화재 관리국) |
지명 중에 ‘반월’, ‘반달’이 들어간 친근한 옛 지명이 곳곳에 남아있다. 성(城), 섬(島), 리(里)를 붙이면 더 많은 지명이 드러나며 설화, 형세로 역사의 향기가 서려있다.
초등학교 시절에 ‘반월성’과 ‘반달’ 노래가 새겨져 더욱 정감이 가는 단어이다. 최근 ‘반월성의 형세’를 궁구 하면서 삼국시대에 신라, 백제, 고구려에 ‘반월성’이 있었다는 것에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천년고도 신라 경주의 ‘반월성’을 살펴보면, 《삼국사기》에 이사금 (101년) 때 낮은 고지를 고른 후 내성(內城)을 축성했고 나성(羅城) 대신 왕성 주변의 산에 산성을 쌓아 적을 대비했다. 성내에 귀정문 외 몇 개의 문과 명학루 외 4개의 누각이 위치하고 있는데 왕궁을 둘러싼 성이 반월형 모양으로 형성돼 반월성이라 불렀다.
백제의 도성 부소산성을 《삼국사기》〈백제본기〉에서 찾아보면, 성왕 때 산 정상을 퇴뫼식으로 구축했고, 무왕 때 와서 복겹식 산성으로 개조했다. 부소산 양두(兩頭)가 낮게 둘러져 백마강을 향해 초승달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어 반월성이라 했다.
고구려 땅인 포천군 군내면의 청성산 능선에 위치한 반월산성이다. 《포천군읍지(抱川郡邑誌)》, 《견성지》 따르면 고구려 시대에 축성된 성(城)으로 조선시대 인조 때까지 이용됐으나 그 후에 폐허로 변했다. 성(城)의 모양이 반달 형태에서 인용한 것으로 반월산성(半月山城)으로 불러졌다. 성내에는 장수의 지휘대였던 장대터, 적의 동정을 살피기 위한 망대터 등이 있다.
삼국의 반월성들은 풍수적 국세와 지기를 평가해 성(城)을 축성한 것이 아니라, 왕궁을 수비하기 위한 목적에 지형을 요충지로 이용한 것이며, 우연의 일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삼국사기)三國史記》<(범저채택열전)范雎蔡澤列傳>에 ‘일중즉이월만즉휴(日中則移月滿則虧)’ 말이 있다.
해가 중천에 오르면 서쪽으로 기울고 달도 차면 이지러진다는 말로, 무슨 일이든 절정에 달한 뒤에는 쇠퇴하게 된다는 우주의 이치를 인용한 것이다.
즉 ‘반월은 신월(新月)이라’ 함은 커져가는 운명이요, ‘만월은 휴월(虧月)이라’함은 기울어져 갈 운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삼국의 흥망에 비유할 따름이지, 풍수 유형에서 유래한 것은 결코 아니며, 당대에 일관(日官)이 지상(地相)에 관한 관념일 뿐이다.
굳이 풍수적으로 언급한다면 반월은 차차 만월이 됨으로 동산에 반월이 보이는 곳을 혈처로 보는 ‘동산반월형(東山半月形)’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형상은 궁성의 길지에 맞지 않다.
 |
| ▲이동환 풍수원전연구가 |
반월성은 곤륜산 옥을 갈아 직녀의 빗을 만들어 허공에 던진 황진이처럼 지상에 흙을 깎아 만든 요새지 궁성일 뿐이다. 글자에 담긴 뜻 외에 다른 의미 부여는 거품에 불과하다.
머지않아 삼국삼성(三國三城)인 빈 반월성에 추풍에 낙엽이 떨어지면 흥망의 유수함이 자연의 섭리임을 느껴질 것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