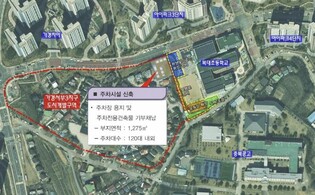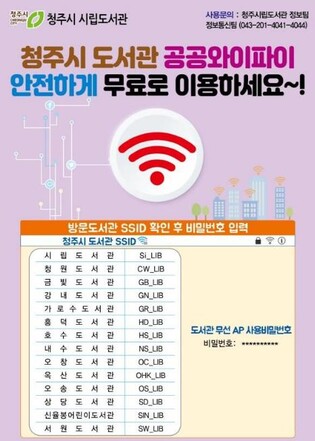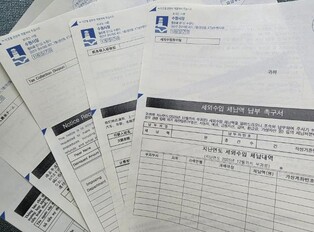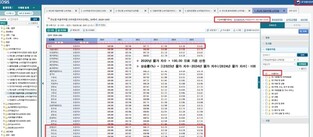중고차 매매업은 자동차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660㎡ 이상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등록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2012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현재 국토교통부령인 660㎡의 시설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시설기준을 강화하며 종전 330㎡ 기준 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미비로 해당 사업장에 신규등록이 불가해 재산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0년 당시 시의원이던 전철수 의원 발의로 조례 부칙을 개정해 휴업, 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신규등록)하는 것을 포함해 종전 규정(330㎡)를 적용토록 해 관련 문제를 말끔히 해소한 바 있다.
당시 자동차매매시설로 타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공동사업장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다. 이러한 문제로 관할 모구청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소송이 제기되어, 모구청이 패소한 바 있다.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폐업할 경우 임대인이 신규등록을 할 수 없어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분쟁은 또 다시 소송으로 이어져 구청과 행정소송에 이어 끊임없는 소송의 불씨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제를 당시 조례 개정을 통해 해소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당시 경과조치가 미비했다.
매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5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을 따르도록 해 서울시 조례의 구제조치는 완전히 무력화 됐다.
피해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서울에 소재한 강남매매단지로 한정 하더라도 2023년 현재까지 재산권 피해액이 약 2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14개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신규등록을 하지 못해 이를 처분하지도, 사업을 영위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9월12일 박진의원(서울 강남구을)은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의 경우 시·도의 조례가 아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은 자치구의 자율적 정책결정과 권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이 강화되기 이전 기준인 330㎡ 기준 사업장에 대한 재산권 및 사업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매매업계에서는 종전 기준(330㎡) 사업장 구제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다. 시설기준의 적용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일이지만, 선행적으로 상위 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관련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법령의 개정이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관청의 행정력 낭비, 시민간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면, 늦더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 및 사업권 피해를 구제한 사례도 있다.
방법적으로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 기준(330㎡)에 따라 등록한 사업장의 경우 신규등록 시에도 종전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면 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330㎡ 기준 사업장에 대한 구제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주저하거나, 부정적일 이유가 없다. 엄밀히 말해 구제가 아닌 종전 기준 사업장이 침해받은 재산권과 사업권을 바로잡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전향적인 국토교통부의 행정을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