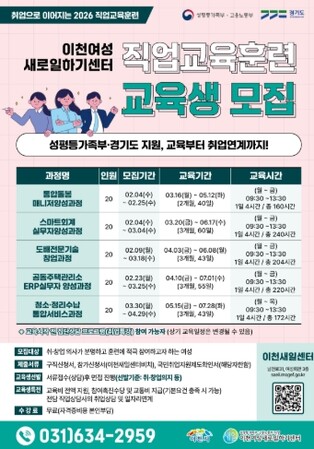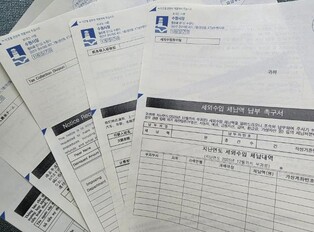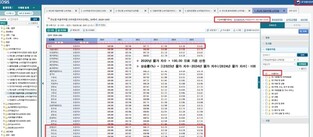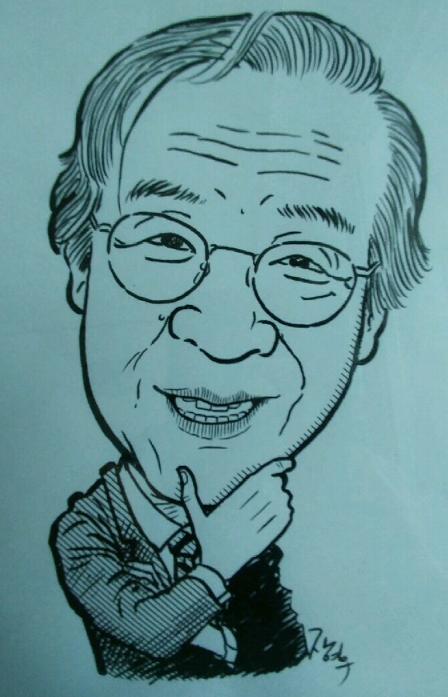 |
| ▲ 정영수 언론인. |
6·25전쟁이 나던 해 봄 나는 서울 만리동에 있는 봉래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손기정 선수를 배출한 양정학교와 담하나 사이인 이 학교는 1895년에 관립정동소학교로 문을 열었다가 일제강점기에 봉래국민학교로 개명되었다. 행정구역이 일본식인 봉래정(町)으로 바뀐 것이다.
청일전쟁에 출병할 일본군이 들어와 만리창(萬里倉)에 진을 치고 제일 먼저 남대문 안에 들어가 일본인들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신변에 불안을 느끼던 일본인들은 마치 ‘지옥에서 신선이 사는 봉래산으로 옮겨온 느낌’이라며 남대문 밖 마을을 ‘봉래’라고 이름 붙였다. 봉래산(蓬萊山)은 중국의 선인(仙人)들이 산다는 전설의 삼신삼(三神山) 중 하나다.
나와 함께 그해 갓 입학한 조무래기들이 운동장에 일렬횡대로 죽 늘어섰다. 초봄이었는데 그때 사진을 보니 모두 반바지차림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완전히 왜정 때 식이다. 해방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왜색은 그대로이었던 것 같다. 선생님 중에는 더러 각반(脚絆)을 맨 분도 있었다. 이윽고 성능이 좋지 않은 확성기에서 명령이 떨어진다.
“일동 앞으로 나와 우선 가방을 집는다”
모두 몇 발짝 앞으로 나가 란도셀(등에 메는 일본식 어린이가방)을 집어 들고 다음 지시를 기다린다. 이어 구령에 따라 앞에 놓인 필통, 주판같이 생긴 숫자놀이, 공책 등을 차례로 주워 가방에 담았다. 필통에는 연필 몇 자루와 석유냄새 풍기는 색색이 지우개 등이 들어있었다.
‘란도세루(ランドセル)’는 일본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메는 책가방이다. 네모난 건빵같이 생긴 이 가방을 6년 동안 메고 다닌다. 란도세루는 네덜란드어 '란슬(Ransel)'을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육지가 바다보다 낮은 네덜란드 어린이들이 물에 빠졌을 때 튜브 대용으로 쓸 수 있으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덮개가 달린 채 등에 메는 가방의 일종인 란도셀은 원래 일본 에도(江戶)시대의 막부가 서양식 군대제도를 도입할 때 장병들에게 지급한 배낭이었다. 네덜란드산 이 배낭을 일본식으로 읽어 ‘란도세루’로 변했고 우리도 덩달아 란도셀이라 부르지만, 우리말 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은 속어다.
언제부터인가, 군장(軍裝)이던 란도셀이 유치원 학생들의 통학용 가방으로 채택되면서부터 일본의 근대화가 시작된다. 말로는 "교육 장소에서의 평등"이지만, 소위 다이쇼 덴노(大正天皇)의 로열학습원 입학 때 란도셀을 하사하면서부터 서서히 란도셀이 소학교용 ‘금수저’ 가방으로 위세를 떨쳤다. 자초지종을 알고 보면 우리가 멜 가방은 아니다.
처음엔 가죽제품이었으나 대량생산 되면서 인조피혁 제품이 70%로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소와 말가죽의 고급화된 제품이 여전히 인기가 높고 색상도 검정색과 빨간색 두 가지만 있던 것이 최근엔 핑크색, 갈색, 녹색 등 20여 가지가 나와 어린이들을 현혹하고 있다.
일본 란도셀 가방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10만 원짜리부터 기능성과 디자인에 따라 최고 115만원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란도셀이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게도 제법 나가 일본에선 초등학생들의 등골을 휘게 하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학생도 있다는 이 란도셀이 국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니 걱정이 앞선다.
수입산 가격이 수십만 원을 호가하고 있어 우리 학부모들의 어깨를 무겁게 만든다. 초등학교 개학을 전후로 학부모들은 물론 손주와 조카를 위해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소비층까지 가세하면서 일본에서 수입한 수십 만 원대의 란도셀 가방이 온라인시장에 나와 있다. ‘제국주의의 상징’이기도 했던 책가방이 정작 일본에선 한물 가 어린 시절 추억의 상징인 인테리어로 전락하고 있다는데 말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