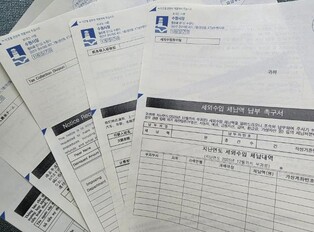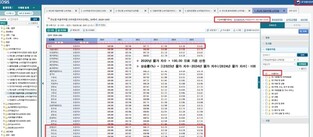나는 30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책을 읽었다. 이쪽 일을 하는 사람치고는 늦게 시작한 편인데, 좋은 학인들과 함께 읽다 보니 금방 책 읽는 습관을 들였고 독서량을 늘려갔다.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책을 읽은 그들과 달리 ‘잘’ 읽지 못해서 아등바등하기도 했다. 내용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워 자기 주관을 갖고 읽거나 책에 대한 내 입장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린 해석을 내 생각인 것처럼 주입했다.
주체적 읽기. 기존의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텍스트를 읽어내는 것을 말한다. 강의 현장에서도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 ‘책을 주체적으로 읽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학공식 풀 듯 답을 명쾌하게 내리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 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책이든, 영화든, 사회문제든 주체적으로 읽고 해석하려면 자기만의 세계와 시선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잎을 틔우는 토양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남들이 만들어놓은 해석에 의존하며 습득하는 것에 그치기 쉽다.
주체적으로 책을 읽고 싶었던 내가 선택한 방법은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찾아서 읽는 것이다. 비주류의 삶을 사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약자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는 활동가들의 시선을 경험하고 싶었다.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직시하고 내 ‘인식’의 범위를 넓히고자 했다.
현장의 목소리가 겹겹이 포개어질 때마다 내가 갖고 있던 기존 관념과 생각들이 깨졌다. 내가 별 생각 없이 누리던 시설이나 규칙·문화들이 누군가는 누리지 못하는 특권으로 비쳐질 수 있음을. 살면서 몸에 익힌 ‘자연스러운 것’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는 비수가 돼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을. ‘여성학’을 공부하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류(남성)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이 세상은 폭력과 희생·불평등으로 만연해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디 약자가 여성뿐이겠는가. 어린이·청소년·장애인·성소수자·노동자·동물 등. 이 세상엔 주류의 시선에 가려진 수많은 약자의 삶이 존재한다.
내가 동물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게 됐다. 소설은 거대한 청새치에 맞서는 늙은 어부 산티아고의 이야기를 그린다. 망망대해에서 홀로 고기를 잡는 산티아고는 84일째 아무런 수확도 없이 배에서 고독의 시간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청새치가 걸려드는데, 치열한 사투 끝에 노인은 청새치를 낚는데 성공한다. 청새치를 뱃전에 묶어 육지로 돌아오던 중 노인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의 공격을 받는다. 산티아고는 상어로부터 청새치를 힘겹게 지키지만, 결국 머리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잔해를 끌고 육지에 도달한다.
1952년에 출간된 이 소설은 헤밍웨이에게 많은 수상의 명예를 안겼고 세계명작으로 불리며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널리 읽혀왔다. 소설 속 노인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패배하진 않는다” 이는 고된 상황에서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굴복하지 않는 ‘인간 승리’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청새치의 입장에서 이 소설을 읽으면 어떨까.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에서 갑자기 자기 몸을 뚫고 들어오는 날카로운 작살.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해가는 고통과 진해지는 피 냄새. 그리고 그 냄새를 맡고 청새치를 먹기 위해 몰려오는 상어 떼들. (청새치에게는 들리지 않겠지만) 청새치에게 애정(?)을 보이면서도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는 노인의 이상 행동. 이렇게 읽으면 소설이 또 다르게 보인다. 인간의 정신 승리를 위해 청새치는 무슨 죄로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작가는 어부로서 노인의 자긍심을 꼭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그 안에서 인간의 폭력성과 잔인함을 읽었다. 인간의 고귀함을 위해서라면 다른 생명은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인간중심사고. 만약 청새치가 아니라 인간과 닮은 원숭이나 침팬지였다면?
과한 해석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문학을 읽는 또 하나의 시선이다. 고전은 시대를 거듭해도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읽힌다. '노인과 바다'는 그런 의미에서 명작으로 꼽을만하다. 하지만 고전이 읽히는 시대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면 그에 맞춰 작품도 재해석돼야 하지 않을까? 사냥·낚시가 취미였던 작가가 살았던 시대에는 아무렇지도 않았겠지만, 동물의 복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21세기에는 이 소설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다.
프란츠 카프카는 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의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는 도끼여야 한다” 주류의 생각·기존의 관념을 깨려면 그 도끼의 날을 날카롭게 벼려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몸에 새긴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깰 수 있는 책을 읽어야 한다. 주체적인 읽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렌즈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해진다.
나는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그 시선은 주류의 세계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자유로운 내 시선이 또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 너무 많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