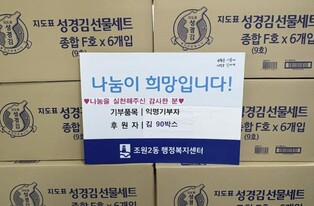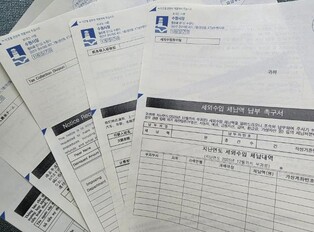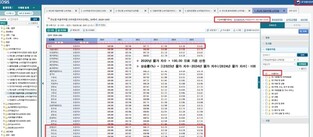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적용 기준을 놓고 말이 많다.
검찰은 최근 카카오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재차 구형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1월 이 전 대표를 아청법 위반혐의로 기소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아동음란물을 규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아 카카오그룹에서 아동음란물이 배포됐다고 주장한 것.
이후 2016년 5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으나, 당시재판부가 아청법 조항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해 재판이 중단됐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현행 아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하면서 중단됐던 재판이 2년 만에 재개돼 벌금을 다시 구형했다.
아청법 제17조 제1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지만, 카카오그룹은 아청법의 금지어 필터링을 도입하지 않아 아동음란물이 배포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자유·개방·공유의 터전으로 이용하기 위한 공론의 장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인 사단법인 오픈넷은 “법에 의하면 상시적 신고 기능은 어떤 방식으로든 갖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5단계라서 접근성이 떨어져 범죄가 된다는 검찰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금지어 필터링의 경우에는 검찰이 지적한 기술만으로는 아동음란물을 효과적으로 필터링하기가 어려워 그 기술의 도입여부로 범죄가 결정될 수는 없다. 키워드를 조금만 바꾸면 무용지물이 되며 아동음란물에만 국한된 키워드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단순히 로리나교복과 같은 키워드가 반드시 아동음란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렇게 부실한 필터링이 범죄여부를 결정한다는 해석이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음란물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이용자의 모든 이미지와 동영상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카카오그룹처럼 폐쇄형 SNS에서는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사인에 의한 감청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더구나 직접모니터링을 한다고 해도 아동음란물 사실여부는 맥락으로 판단해야하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검찰이 모니터링 기능을 도입 안 했으니 범죄라고 자의적으로 규정한다면 카카오가 모든 콘텐츠를 육안으로 확인해야만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니, 이는 일반적인 감시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은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있을만한 일이지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일인가.
오픈넷은 카카오같은 플랫폼사업자에게 특정불법정보를 찾아내 삭제하라는 의무를 강요한다면 결국 그 사업자는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사업자에 의한 사적 검열을 의무화하는 것이고, 자유로운 정보 유통과 공유라는 인터넷 기본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감시적인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검찰의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에 대한 아청법 위반 구형은 유감이며, 이와 관련한 법원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