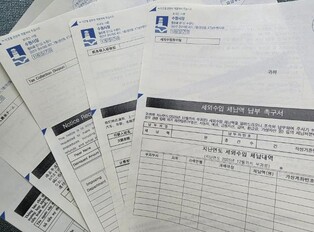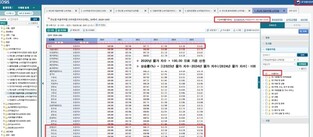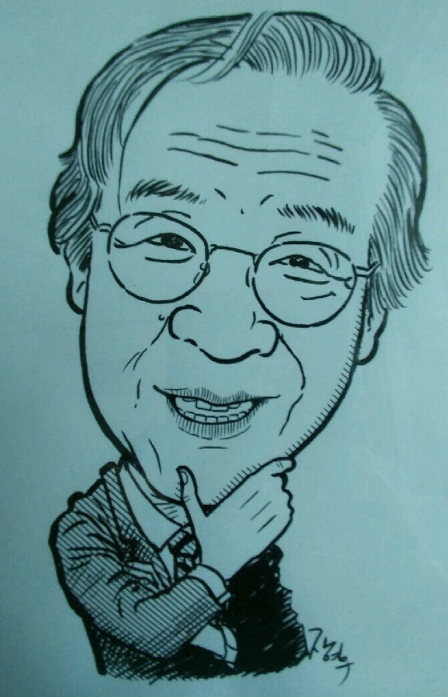 |
| ▲ 정영수 언론인. |
“지금이 최악이라고 말 할 수 있는 한 최악은 아니다” <셰익스피어>
60년대에도 취업난은 마찬가지였다. 필자와 같이 문과대학(그때는 문리대라고 불렀다)출신들은 아예 이력서조차 낼 데가 없었다. 수출입국(立國)이다 개발드라이브다 해서 상경계열, 이공계 출신의 인기가 대단했다. 이른바 ‘펜 대 잡는 일자리’도 법대는 나와야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무역회사에서 영문학과 출신을 뽑는다는 모집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아마도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앞뒤 가릴 것 없이 이력서를 냈다. 운이 좋았던지 면접까지 갈 수 있었다. 그땐 눈만 마주쳐도 겁이 나던 벽안의 원어민(原語民)과 간단한 영어 말하기 듣기 테스트를 거쳐 사장실까지 갔다. 일언이 폐지하고 기업의 장은 절대자다. 두려움이자 존경의 대상이기도 했다.
“전공이 영문학이구만…”
질문인지 혼잣말인지 구분이 안 갔지만, 얼떨결에 “네!”하고 힘주어 말했다.
“영문학도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뭘 중점적으로 했지요?”
그 중 자신 있는 걸로 대답하는 쪽이 유리할 것 같았다. 게다가 더 꼬치꼬치 묻지 않도록 말머리를 돌리고도 싶었다.
“영미시를 주로 했습니다.” 이어 누구의 시(詩)를 많이 읽었느냐, 엘리엇의 황무지에 대해 얘기 해보라는 등 상황이 매우 어렵게 꼬이기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장님이 꽤 난해한 영미시(英美詩)의 화두에서 좀처럼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불과 반 학기쯤 배우다만 나의 ‘황무지(荒蕪地)’실력은 거덜이 났고 진땀을 흘려야만 했다.
그때는 이름 석 자도 몰랐던 그 분은 알고 보니 영미 시에도 밝아 한국엘리엇학회 회장까지 지낸 김광균 시인이었다. 그야말로 ‘임자 만난 것’이었다. 당시 원로 시인으로서 중견기업의 CEO를 겸한 분이 또 있었을까.
차단~한 등불이 하나 /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
슬픈 신호냐
그가 30년대에 쓴 불멸의 시작 와사등(瓦斯燈)이다. 이를테면 '가스등'이라는 이국적 정서에다가 나라를 빼앗긴 설움을 한밤에 비유하여 절망을 상징한 것이리라. 물질문명 속에서 방향감각을 잃은, 쓸쓸한 도시적 삶의 고독과 비애와 우수를 읊었을 것이다.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잃어진 /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회(追悔) /
이리 기쁘게 설레이느뇨.
서글픈 옛 추억이 담긴 ‘설야(雪夜)’다. 눈에 서린 나라 잃은 슬픔일 것이다. 시인이 가신지 어언 25년. 눈이 오는 밤, 시상(詩想)과 조국을 너무나 사랑한 옛 시인의 숭고한 얼을 새삼 되새겨 본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